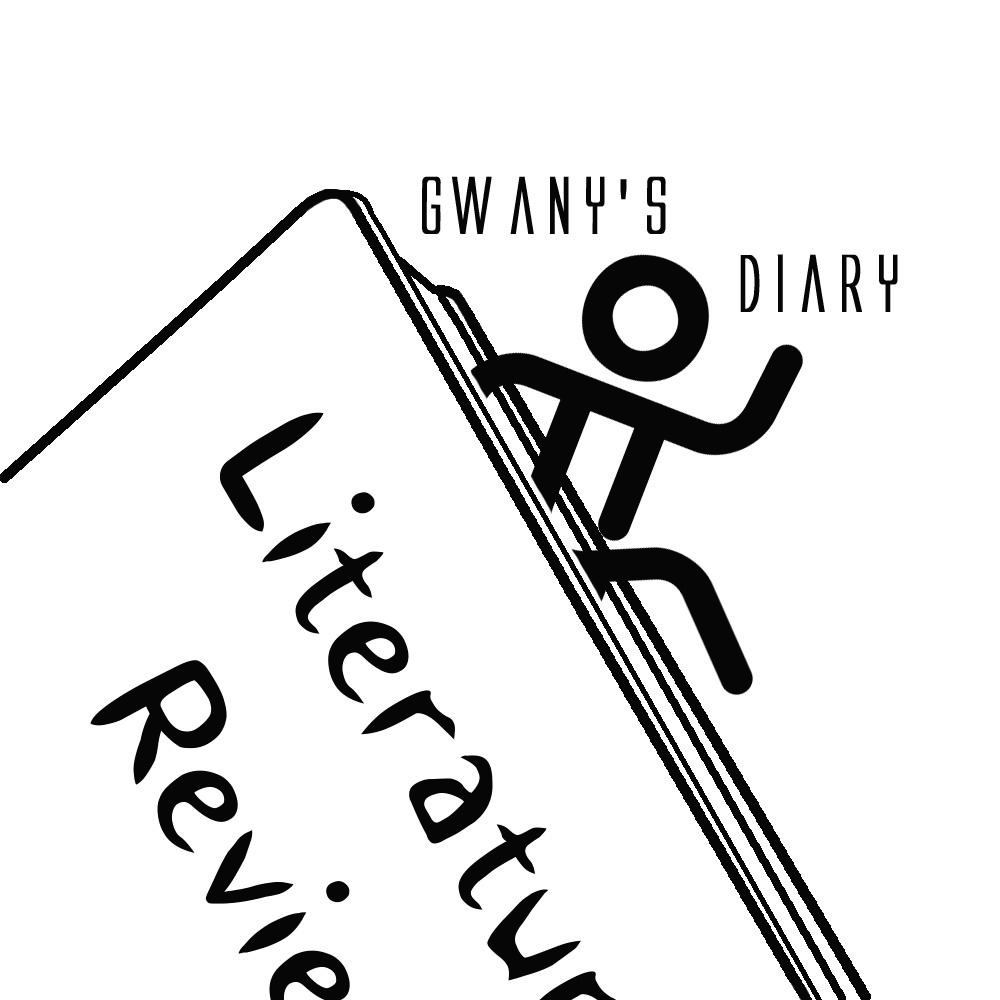과니의 문학리뷰 & 창작 일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2015) 본문

음식점이 바빠지는 달은 정해져 있다. 기념일이 많이 끼어있는 5월이나 휴가철을 제외한 여름,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이다. 이쯤 되면 주말에 들어오는 손님의 수가 부쩍 늘었다. 그리고 그에 덩달아서 음식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손놀림도 분주해졌다. 전화가 온 건 그 때문이었다. 크리스마스까지만 도와달라던 매니저는 30일과 31일까지 좀 도와달라고, 안 그러면 두 명이서 홀과 주방을 전부 봐야 한다는 사정까지 곁들이며 부탁했다. 저녁 6시 즈음부터 나온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1월 1일은 새해라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지만 몇 년을 알바로 뛰어보자 도리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없을까. 단순히 다이어트 때문에? 으레 말하는 불금과 불토, 그리고 늘어지는 일요일을 겪고 난 뒤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처럼 연초의 거리는 한산했다.
파란 넥타이를 매고 걸을 뿐이지 더운 건 매한가지야.
휴학을 하고 인턴활동을 시작한 K가 여름에 한 말이었다. K는 정직원을 꿈꿨다. 한 번 독하게 맘먹고 죽을 각오로 굴러다니면 적어도 시나리오 팀 후보에라도 오르지 않겠냐는 소리였다. 누나는 게임회사를 다녔다. K의 얘기를 꺼내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 안돼.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내 앞에 놓인 프라프치노만 쪽쪽 빨았다. 연신 와이셔츠 앞주머니에 넣어놓은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는 K를 보면서 왜 열심히는 하는데 회사의 인턴제도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에어컨은 생각보다 시원했다. 될 대로 되어라. 체질이 더운 덕분에 나는 카페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K의 요란법석한 회사고충을 미적지근하게 받아주었다. 그의 노고를 따지기엔 내 처지도 별일 없었다. 학점을 쌓아야 하는데 과제하고 알바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어항에서 튀어나온 금붕어마냥 헐떡헐떡 거리는 상태였다. 숨이 차오른다는 건 유산소가 아니고서도 가능했다.
초저녁이었는데도 매장엔 사람이 많았다. 매니저 말로는 1호점은 알바가 펑크를 내서 전부 패닉 상태라고 했다. 그럼 1호점으로 갈까요? 아냐. 잠깐만 있어봐.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그쪽으로 가신 것 같고, 정훈이도 부를 거래. 온가족 총출동이었다. 매장 하나 살리겠다고 연말에 외식도 못나간 채로 사장님 아들까지 호출되었다니. 시덥잖은 농담을 하나 던지려고 하는 사이에 유리문에 달려있던 종이 울리고선 두 팀이 들어왔다. 각 팀 모두 가족인 듯했다. 시킨 메뉴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양이 적어서 꼭 조금 있다가 추가 메뉴를 시킬 법한 음식들이었다. 매니저는 좆같네, 라고 짧게 말하곤 튀김기로 몸을 돌렸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차올랐다. 연말 퇴근이라고 다 같이 온 회사원들은 K같이 호들갑이었다. 연인들이 있는 17번 테이블은 그나마 조용했지만 3번과 4번을 붙여서 앉은 동창회로 보이는 아저씨들은 창고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7번과 8번에 앉아있는 가족들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애들이 다른데 가서 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온 눈치였다. 음식을 가져다주면 음료를 시키고, 음료를 가져다주면 밑반찬을 시키고, 메뉴판을 가져다주는 도중에 매니저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음식을 집는 순간 두 개의 테이블에서 동시에 벨이 눌렸다.
자정이 다되어갈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빈 테이블 하나 없이 꽉 들어찬 사람들이 술까지 마시자 매장은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후덥지근해졌다. 전화벨로 포장주문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피곤했다. 이 사람들도 저렇게 마시고 나면 새해 아침은 숙취로 망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에까지 생각에 미치자, 몸이 조금 나른해 지는 것 같았지만 잠깐이었다. 야. 1호점 가야되겠다. 매니저가 급하게 날 잡고 말했다. 사모님 쓰러지셨대. 예? 왜요? 주방 작업 중에 기름이 바닥에 샜는데, 바쁘셔서 못 치우고 계시다가 넘어지셨나봐. 구급차 불렀다니까 빨리 가봐. 유니폼 그대로 입고. 알겠어요.
선반에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어쩌다 전원 버튼을 눌렀는지 잠금화면이 켜졌고, 시계는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에는 가뭄에 콩 나듯 하던 알림이었는데 문자와 SNS 메시지가 가득했다. 연말연시 인사일 것이었다. 유리문의 종이 한 번 더 울리고 피곤해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온 것과 내가 뛰쳐나가려고 한 것은 거의 동시였다. 부딪칠 뻔한 것을 가까스로 피하자 아이, 미안합니다. 라고 남자는 사과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혹시 다섯 명 자리 있을까요?
없어요.
아… 여기도 없으면…….
포장하세요.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다함께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했다. 새해 카운트다운이었다. 십! 구! 남자는 가족들이랑 온 듯했다. 입까지 목도리로 싸맨 할머니, 얇은 외투만 하나 걸친 열 살배기 아이, 애를 앞으로 안은 여자. 그리고 많이 피곤해 보이는 앞의 남자. 나는 매장 안을 한 번 더 둘러봤다. 팔! 칠!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테이블이 있을거에요. 포장해가시거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 삼! 여기 손님 한 팀 더 있어요!
이! 일!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유리문에 달려있던 은색 종이 스피커에서 나올 제야의 종소리 대신 거칠게 울렸다. 1호점은 여기서부터 멀지 않았다. 정신없이 홀을 보고 있어서 밖을 신경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발길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벌써부터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횡단보도의 빨간불이 좀체 바뀌질 않았다. 저 멀리서 앰뷸런스가 오는 것 같았다. 지친 발걸음들과 집으로 향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유난스럽게 바람에 부대끼며 흔들거리는 것은 ‘해피 뉴 이어’ 라고 써진 구청장 직원일동의 현수막뿐이었다.
2015년도, [제목 지정 소설]이라는 미션으로 썼던 한장 소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한장 소설이다.
'창작 >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양이 (한장소설) (2020) (5) | 2021.01.22 |
|---|---|
| 있을지도 모른다 (2015) (1) | 2021.01.14 |
| 엘리제를 위하여 (2018. 짧은 글) (4) | 2021.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