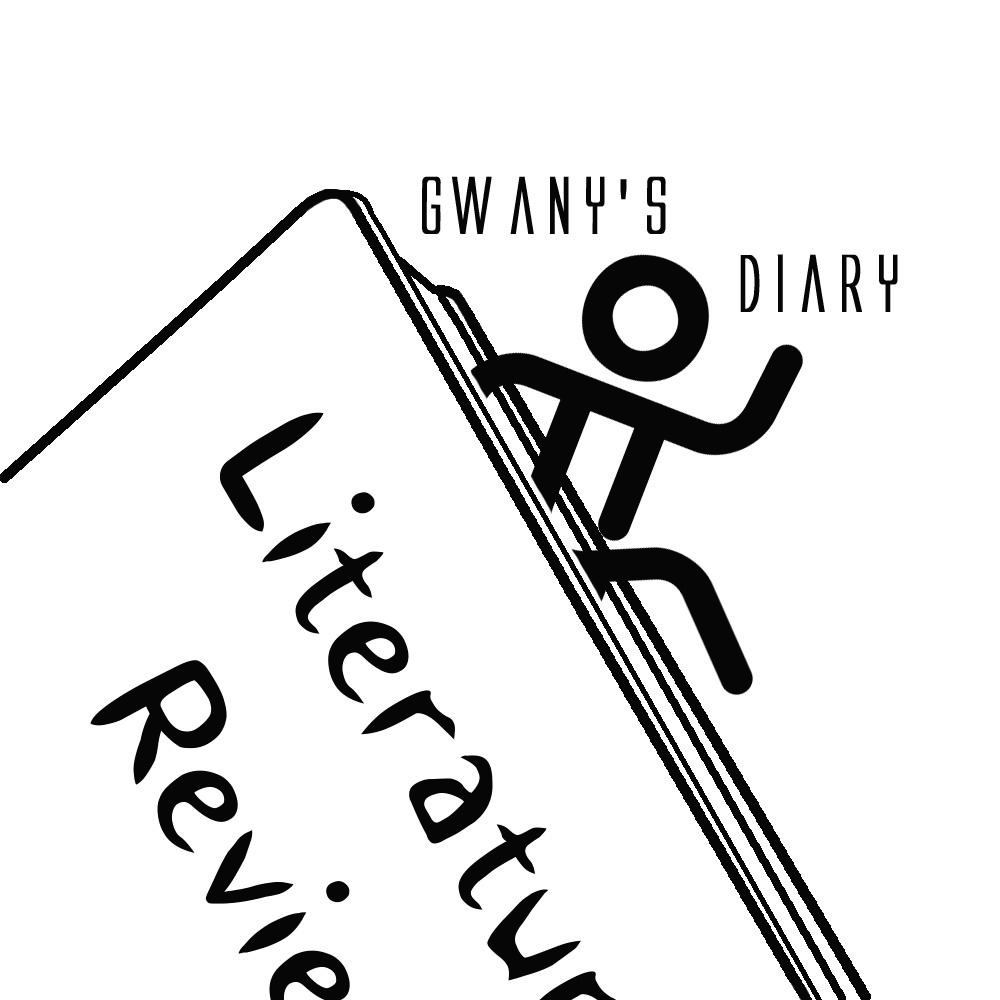목록창작/시 (4)
과니의 문학리뷰 & 창작 일지
 봄의 기억 (감성글귀)
봄의 기억 (감성글귀)
내 발뒤꿈치에서 기생하던 언어들을 기억해냈을 때는 겨울이었다. 한밤 중 가로등 아래 짙게 깔린 어둠에서 밤새 부스럭소리가 난다. 자야 할 공간은 있는데 돌아갈 집은 없어진 것만 같아 울어버린 적을 기억한다. 계절은 쉬이 바뀌지 않아서 나는 어딘가의 길고양이처럼 웅크려 잔 적이 잦았다. 봄은 몇 개의 서릿발들을 손으로 쓸어도 오지 않았고 귀가하는 버스에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봐도 오지 않다가 해가 바뀌어 이루지 못할 신년 계획을 세우고 지나간 날들을 실패로 기억할 때 즈음 찾아왔다. 그게 덧없이 따뜻하고 아리게 푸근해서 나는 나의 모든 봄을 기억한다. **2~3번째 줄은 강성은 시인의 시 「기일」에 영감을 받아 써졌음을 밝힙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원룸-감성과의 동거'를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볼..
 쥐(2018)
쥐(2018)
모든 생각은 자정이 지나면 좌절되었다. 새로운 것들이 밀려오는 만조의 시간. 손톱깎는 소리로 시계의 초침을 속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정직해지지 못한 죄로 나는 표류하는 쥐가 되었다. 달빛도 비추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남기고 간 발자국을 뜯어먹으며 나날에 서식했고 나날히 서식했다. 남색으로 출렁이는 파도가 칠 때마다 거품은 육지로 밀려갔다. 밀려왔다. 고장난 시곗바늘에 찔린 사실을 모르는 나는 죽어가는 사실도 모른 채 당신을 어디선가 봤단 사실도 모른 채 내가 사실은 바다가 아닌 모래사장 속에 묻힌 흰 쥐인지도 모른채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도용하시면 친고죄로 형사소송 들어갑니다 교수님은 이거 못쓸거라 그랬지 ㅠㅡㅠ 지금 보니 못쓰긴 했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ㅡㅠㅠㅠㅠㅠㅠㅠ..
 젖은 옷을 쥐고서 (시>글귀) (2020)
젖은 옷을 쥐고서 (시>글귀) (2020)
달이 수면을 꼬집어 올리면 썰물은 시작되었다 소금기 가득한 아흐레의 밤을 저며내어 두 장의 편지와 제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을 흘려보낸 누나를 처음 볼 때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건만 구멍이 무색하게도 전분물마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검은 갯벌의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다 밤이 철지난 안부를 자처하고 있다 현아 가루는 천천히 뿌려야 한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울어버리면 아무 것도 놓질 못하니 무던히 바라보거라 입술을 물고 온몸으로 울던 소년과 아픔을 소리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 습기에 매몰될까봐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다 갯벌은 새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고 바다에서 날고 있는 것들은 너무 깊어서 보내고 나면 돌아오기를 바랄 수 없는데 수평선에 떠 있는 것만이 보내고 나서도 돌..
 실수로 쓴 편지 (감성글귀)
실수로 쓴 편지 (감성글귀)
나는 분홍빛 이별을 접었다. 안녕. 안녕. 나의 혼잣말들이 종이에 써진다고 해서 편지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만발한 꽃무더기들 속은 그늘져있었다. 푹신한 향기를 맡기에는 나는 너무 아래로, 혹은 너무 멀리 지나쳐갔나보다. 당신에 대해 나는 여태 아는 게 없었고 낮에 뜬 달은 가늘고 희미해서, 날이 지는 동안 내가 쓴 편지들은 어디로도 보낼 수 없었다. 창밖으로 되다 만 말들이 어물쩡거렸다. 벌레도 꼬일 일 없는 문장들이 방 한구석에서 피었다. 안녕. 안녕. 나는 인사를 건네고 이별을 말한다. 혹은 이별을 말해놓고서 뻔뻔하게 인사를. 모진 글씨들은 내가 만들어놓고서 구겨졌다. 다정한 호흡이 나올 순 없는 일이었다. 연달아 밀봉한 편지봉투의 오른쪽 아래엔 죽죽 그어진 펜선도 없고 이름이 씌여졌다 지워진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