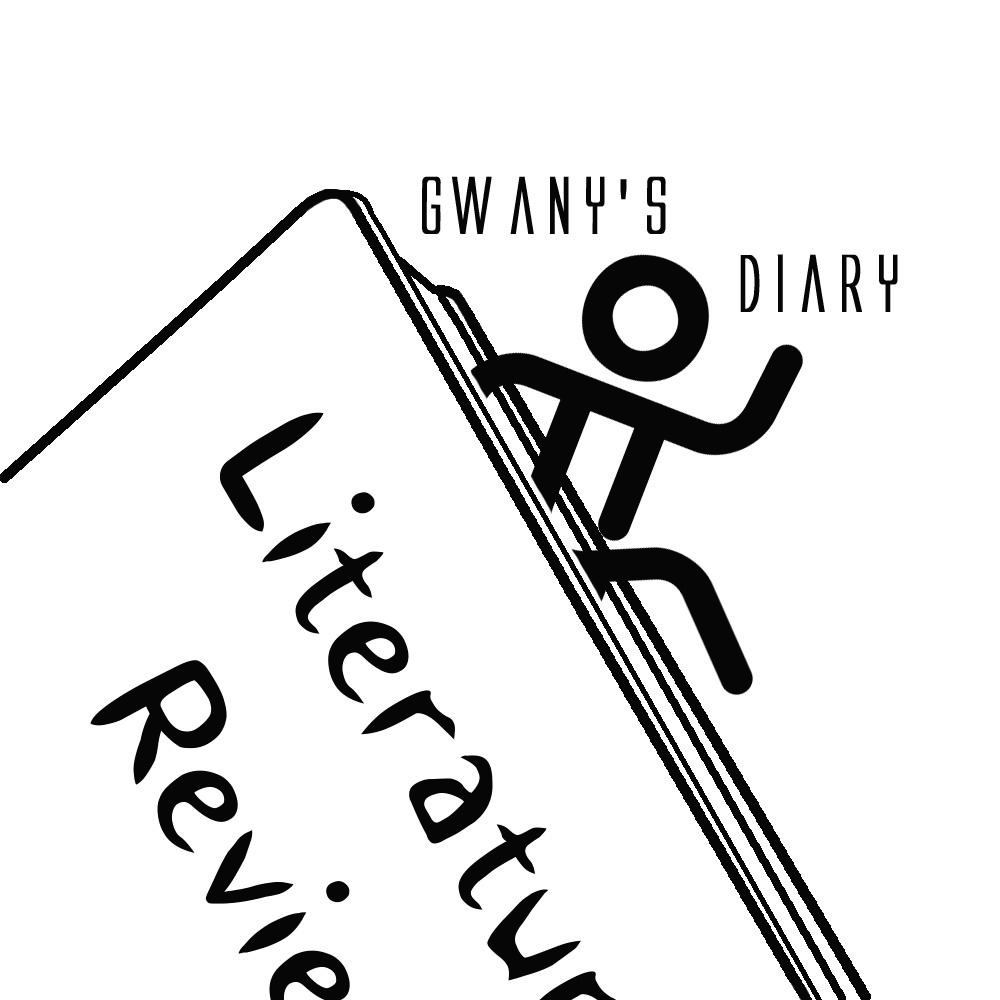과니의 문학리뷰 & 창작 일지
김언의 혼백 - 시「유령산책」 본문

(개인적으로 시식, 혹은 시음식이라고 부른다.
시인이 이 시에서(혹은 이 시집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기록하기 위한 카테고리
대부분 '문학동네', '문학과지성', '창비' 시집임을 밝힌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존재론'에 대한 물음은 피할 수 없다. 아니 뭐, 피할 수 없다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다만, 답을 찾을 수 있다고도 못하겠다. 흔히들 말하는 '중2병'의 감성으로 비장하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봐봤자 답은 나오지 않으며, 종교적인 관점을 참고하려 해도 난감하다. 거울에 비치는 나도 모르는데 교회는 보이지도 않는 신의 존재를 믿으라고 하고 있고, 불교에 조예가 있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답이 들려왔다. 덕분에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있다 보면 그나마 데카르트의 말이 가장 그럴싸해 보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또한 존재론적인 물음에 완전한 해답을 가져다주진 못한다. 존재에 대해 사유하는 행위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존재론이 성립 가능하나,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육체, 혹은 이 공간에 내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싶을 때가 오면 데카르트의 말은 반쪽짜리가 된다. 나머지 반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 김언이 다가온다.
직전의 영혼은 모두 유령이었다.

그는 인간의 '심신'을 분리시켜 '혼'과 '백'으로 나눠 말한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동안 성립되는 것은 '혼'이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사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니, 정신은 존재하되 육체가 없는 (영혼뿐인)유령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백'이 성립되는 순간이 온다.
그의 눈에 띄면서 나는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무인도에 갇힌 사람의 존재를 누가 알 수 있을까. 돌로 SOS를 만들고, 불을 피우고, 하루종일 깃발을 흔들며 "나 여기있어요!" 소리쳐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는 '신원미상의 실종자'일 뿐이다. 실종자의 사전적 정의는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다. 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명확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 그러던 어느날, 구조대가 그를 발견한다면? 누군가가 외친다. "저기 사람이 있다!"
나의 보행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김이 그의 눈에서 순간 빛나고
나는 놀란다. 사람이 된 것이다.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눈으로 나를 봐줄 때 나의 육체가 그곳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생사도 불분명한 혼 하나가 '발견'되었기에 '백'을 얻는 과정이다. 김언은 온전히 존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단 한명의 타자라도 존재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지 못하면 산 속에서 피어난 꽃과 어떠한 차이인지 모르니까. 애초에 그런 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직접 발견하지도 않았으니까.
김언은 '타자'가 있음으로서 나뿐만이 아닌 타자의 존재 또한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음 또한 빠트리지 않는다.
멀리서 나를 발견한 그는 가까스로 유령에서 빠져나왔다.
시는 짙은 새벽을 배경으로 하기에 다 읽고 나면 스산한 분위기가 온몸을 감는 느낌이 온다. 유령산책은 어떤 시들보다 모호한 인간의 존재와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실제로 만들어내는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말한다. 사유와 행동의 경계선을 잘 포착해 서술한 시들이 시집에 밀도 있게 담겼다. 다 읽게 된다면 제목인 [모두가 움직인다]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씩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러니 파란만장한 사춘기의 종결은 두 명의 철학자를 같이 데리고 와야 끝날 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하고 고로 존재하지만(데카르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은가(아리스토텔레스). (웃음)
'문학리뷰 > 시집 리뷰「시음식(詩吟式)」'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백의 전후 - 한강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3) | 2021.01.07 |
|---|---|
| 당신의 새해, 그리고 오은의 달력 - 시 「1년」 (1) | 2020.12.26 |
| 모두 읽어야 완성되는, 서효인 시집 [여수] (5) | 2020.12.21 |
| 카르마를 곁에 둔 심보선 - 시집 [오늘은 잘 모르겠어] (1) | 2020.12.17 |
| 심재휘의 연필깎이 - 시집 [중국인 맹인 안마사] (1)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