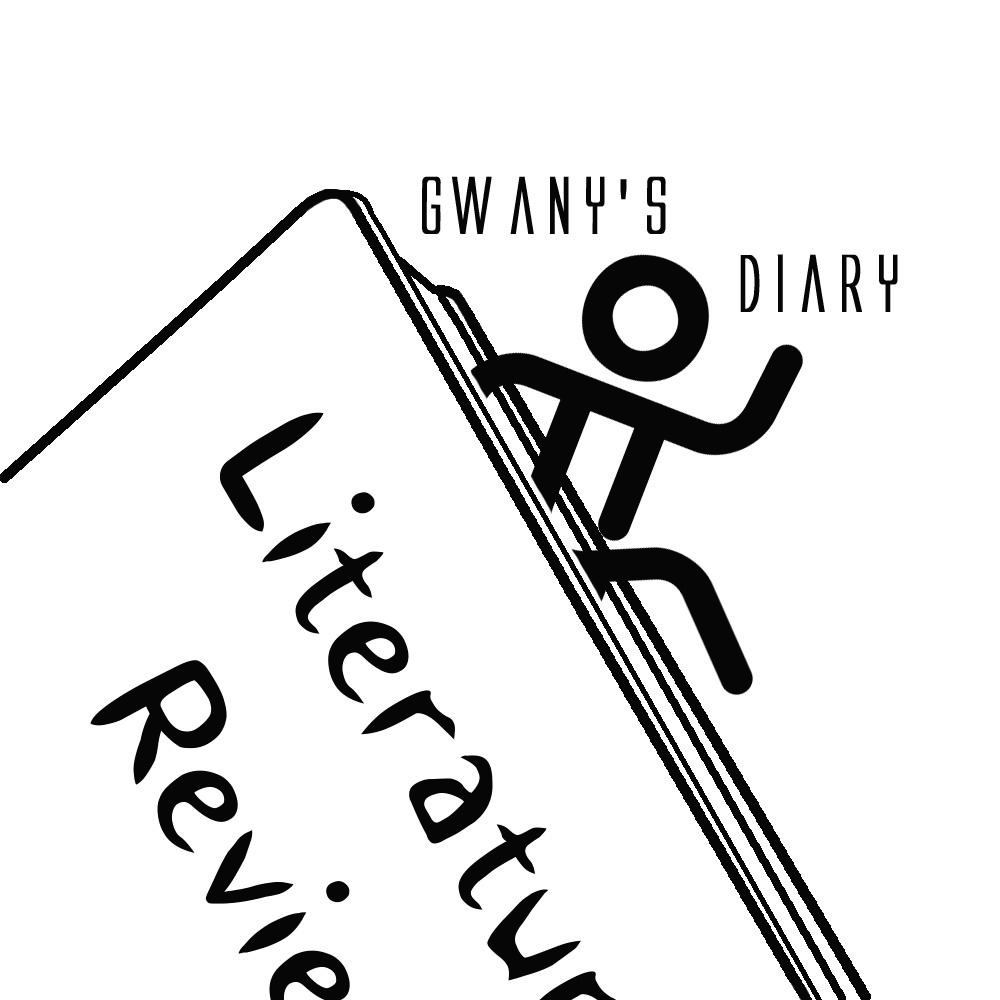과니의 문학리뷰 & 창작 일지
김이듬과 '이단' 본문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그녀의 시에 대해선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김이듬은 금기(터부)다. 김이듬은 경계다. 혹은 그녀는 술에 한껏 취하고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거나, 미친년이다. 그보다 파격적이고 은밀하게 그녀를 표현할 만한 단어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가져다 그녀의 이름 앞뒤에 접사마냥 붙이고 싶다. 흔히들 말하는 '관종'이란 딱지도 그녀에게 붙이기엔 가녀린 스티커다. 몸속에 흑염룡을 몇 마리씩 키우고 있다는 작자들을 데려온들, 그쪽이 '숨겨진 힘'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숨겨진 7대 죄악일 것이다. 연재 컨셉이 시집 1권당 대표작 1편임을 잊어먹었다면, 아마 온갖 작품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아주 망설임없이 작품을 선택했다. <시골 창녀>다.
(중략)
집안 조상 중에 기생 하나 없었다는 게 이상하다
창가에 달 오르면 부푼 가슴으로 가야금을 뜯던 관비 고모도 없고
술자리 시중이 싫어 자결한 할미도 없다는 거
인물 좋았던 계집종 어미도 없었고
색색 비단을 팔러 강을 건너던 삼촌도 없었다는 거
온갖 멸시와 천대에 칼을 뽑아 들었던 백정 할아비도 없었다는 말은
너무나 서운하다
<시골 창녀>는 자신의 조상들 중에 천한 신분은 하나도 없았다는 아버지의 말에 서운해하는 시다. 백정이던 기생이던, 노비나 계집종도 없이 집안 사람들이 너무 고결하게 살았다니 서운해한다. 서운해하는 모습을 화자의 아버지는 어처구니 없게 바라볼 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진하기에 재미있다. 글만 읽는 선비들만 가득했던 집안이라니. 이 얼마나 고루한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자는 자신이 기생이자 창녀임을 말한다.
(중략)
나는 기생이다 위독한 어머니를 위해 팔려 간 소녀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감정 창녀다 자다 일어나 하는 기분으로 토하고 마시고 다시 하는 기분으로 헝클어진 머리칼을 흔들며 엉망진창 여럿이 분위기를 살리는 기분으로 뭔가를 쓴다
다시 나는 진주 남강가를 걷는다 유등 축제가 열리는 밤이다 취객이 말을 거는 야시장 강변이다 다국적의 등불이 강물 위를 떠가고 떠내려가다 엉망진창 걸려 있고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더러운 입김으로 시골 장터는 불야성이다
그녀는 애초에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기생질을 하지도 않았고(화자는 현대에 있다), 창녀짓을 하는 것도 아니다. 화자가 말하는 그 모든 장면은 화자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녀는 고루한 정사가 될 바에는 백치미 넘치는 야사가 될 거라는 듯이, 정장 입고 클래식 음악을 들을 바에는 팔찌 달고 홍대 클럽에서 춤추겠다는 듯이 말한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창녀'와 '기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음란함과 일차원적인 방탕함이 아니다. 체면 차리기 급급한 기성 세대들에게 보란듯이 누드 화보를 찍는 행위예술가 같으며, 한결 흐트러짐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같잖고 고리타분한 것인지 나를 쿡쿡 찔러서 알려준다.
(중략)
자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와 절박하지 않게 치욕적인 감정도 없이
나는 감정 갈보, 시인이라고 소개할 때면 창녀라고 자백하는 기분이다 조상 중에 자신을 파는 사람은 없었다 '너처럼 나쁜 피가 없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저는, 그냥 노래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슬플 때 울음이 나오는 것처럼 시가 그런 거였어요." 문학 웹진에서 인터뷰 할 때 그녀가 꺼낸 말이다. 그녀에게 시는 순수한 감정의 흐름이다. 그리고 픽션이 없는 표출이다. 전개가 유려하고 문장은 다듬어져있지만 시의 전반적인 감정은 '날 것' 그 자체와 비슷하니,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김이듬이란 일종의 팜므파탈이자 인간의 재정립이다.
화자의 아버지는 화자에게 너같이 천한 피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는 인간에게 배제될 수 없는 죄악이다. 화자의 아버지도 피할 수 없고, 사대부 선비 집안이었다던 조상들도 피할 수 없는 이면이다. 그러니 김이듬은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비틀리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펜을 불끈 쥔 채 부르르 떨었다
나는 지금 지방 축제가 한창인 달밤에 늙은 천기가 되어 양손에 칼을 들고 춤춘다
살면서 기생의 춤이 보고 싶다고 느껴진 적은 그녀의 시를 보고서 처음 들었다.
김이듬의 시는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틀어진 구석을 보여주기에 되려 온전한 사람을 보여주는 느낌이 강하다. [히스테리아]의 첫 시 '사과 없어요'는 잘못된 메뉴가 나온 집에서 온갖 고민을 하는 화자를, '내 눈을 감기세요'에서는 현타와 자괴감이 죽여주게 오는 화자를, 그리고 '히스테리아'에서는 정말 히스테리와도 비슷한 화자를 발견 가능하다. 물론 감정은 '시골 창녀'처럼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화자의 내면에서 거하게 요동친다. 그 전개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스러워, 나는 읽다 말고 '더럽게 잘쓰네'라고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아니 읽어보면 안다.
김이듬은 암묵적으로 금지된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터부되는 쾌락을 맛보는 대신에 당신에게 해소감을 줄 테니, 거부하지 말길 바란다.
'문학리뷰 > 시집 리뷰「시음식(詩吟式)」'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신의 새해, 그리고 오은의 달력 - 시 「1년」 (1) | 2020.12.26 |
|---|---|
| 모두 읽어야 완성되는, 서효인 시집 [여수] (5) | 2020.12.21 |
| 카르마를 곁에 둔 심보선 - 시집 [오늘은 잘 모르겠어] (1) | 2020.12.17 |
| 심재휘의 연필깎이 - 시집 [중국인 맹인 안마사] (1) | 2020.12.10 |
| 신철규와 어린왕자 (1) | 2020.09.03 |